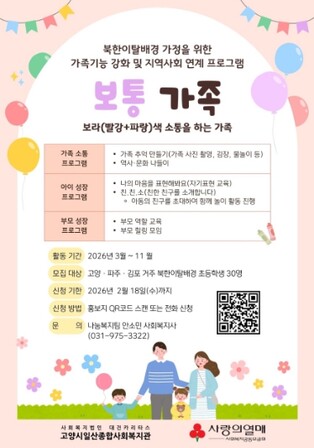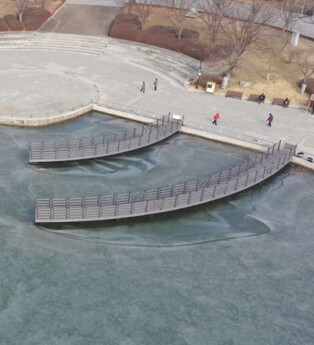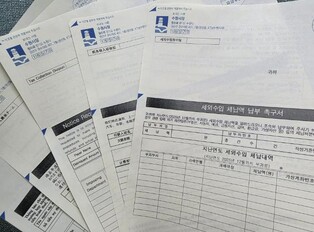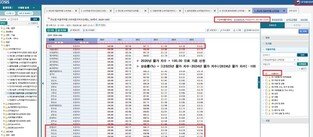|
| ▲ 최문형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
‘흰 소’의 해인 신축(辛丑)년이 왔다. 축(丑)은 소다.
소는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다.
중국문화에서 암소는 두 개로 갈라진 발톱으로 음(陰)을 상징하며 양(陽)을 상징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馬]이다.
호루스 신화의 하토르는 세트의 간계로 장님이 된 호루스의 눈에 신성한 우유를 뿌려 치료해준다. 호루스는 세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신들의 왕이 되고 하토르는 호루스의 부인이 된다.
하토르는 암소 머리를 한 여성으로 묘사되며, 다산·풍요·행복 등을 상징하는 길신이다.
이집트신화의 하토르·이시스·누트 여신은 모두 암소의 모습이나 뿔을 가졌다.
다산과 풍요와 대지의 상징인 암소는 하늘의 암소와 짝이 된다. 난디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로서, 우유와 불로불사의 약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암소는 태모(太母) 즉 양육자로서 달의 여신이며 대지의 생산력을 상징하고 풍요와 모성을 의미한다.
흰 옷을 즐겼던 우리 민족과 맞아 떨어지는 글자다. 모든 색을 다 합하면 검정이 되지만 빛들이 다 모이면 흰 빛이 된다.
이러한 포용과 승화의 힘이 대한민국을 종교와 사상과 정신문화의 나라로 키워왔다.
그의 대표작 ‘흰 소’(1954)는 한국전 이후 황폐한 시기의 시대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흰색은 백의민족, 골격과 근육이 강조된 소의 피폐한 모습은 민족의 고통이다.
‘흰 소’는 화가의 자화상이자 한국인의 삶을 상징한다. 가족과 떨어져 가난과 맞서야 했던 고독한 천재의 몸부림이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 전쟁을 겪어야 했던 유순하고 선한 민족의 아픔이다.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흰 빛처럼 다사롭게, 소처럼 착하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면 그 뿐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